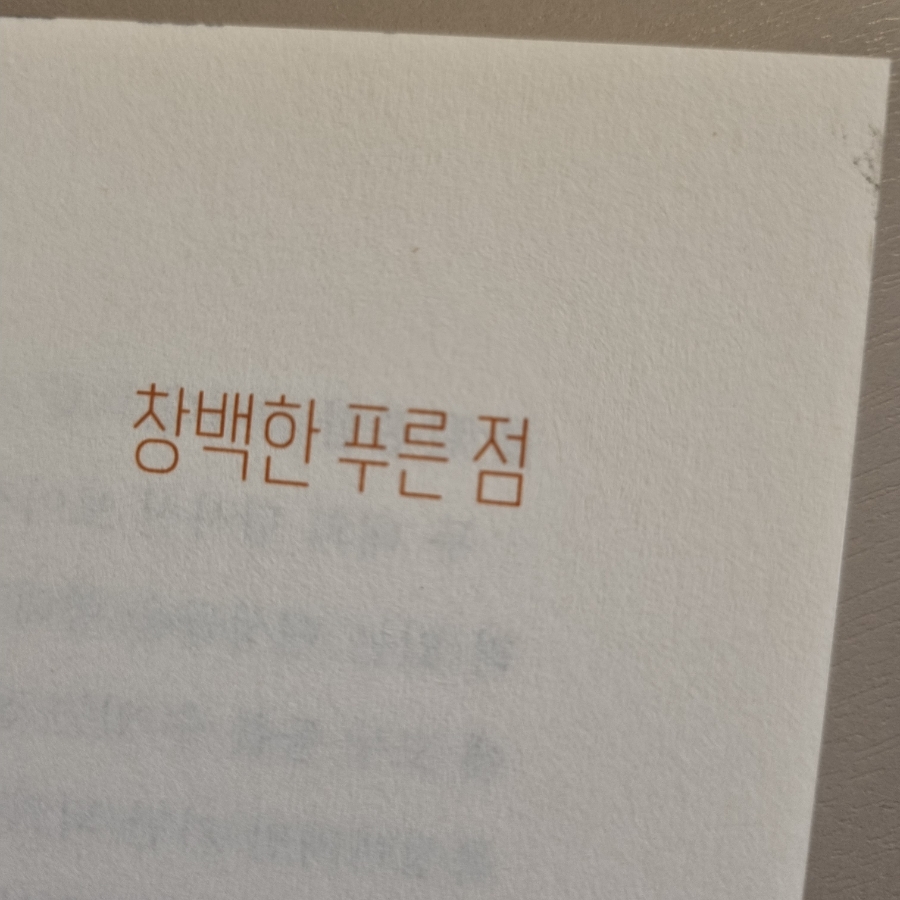현대판 시집스는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31세의 손호준이 스스로 원했기 때문에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기로 했다. 1억원의 제원은 티셔츠를 팔아 충당하기로 할 당시 내가 그에 대해 느낀 것은 현대판 시지프스였다. 5년간 인공위성을 DIY로 제작해 카자흐스탄 옛 소련 우주기지에서 로켓에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해 악착같이 다큐멘터리 촬영에 응했지만 꿈과 희망이라는 홍보 메시지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영화 시사회에도 참여하지 않았으며 일체의 홍보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화를 본 사람들은 그가 젊은이들에게 한국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줬다고 리뷰를 남겼다. 제작자건 출연자건 그들의 의도와 작품을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이 같을 수 없고 같을 수 없지만 망원동 인공위성 출연자와 관객의 시선 차이는 극단적이다. 송호준은 5년간 괴로워했다.
아마추어와 전문가, 개인과 국가의 경계에 대해 질문하고 싶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은 즐거운가. 의미가 있는가. [망원동 인공위성]을 제작한 김현주 감독은 제작 의도를 이렇게 밝히고 송호준의 인공위성 제작 활동에 참여한다.생각보다 빨리 끝나는 손호준(인공위성 발사 직후) 5년이나 걸렸다. 국가는 2억원의 보험료를 요구했다. 발사체가 다른 인공위성화해 충돌할 경우 손해배상 비용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비용은 간신히 절충된 모든 비용을 들여 지구에서 신호를 주면 빛나는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다. 끝이었다.
이 작업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송호준과 김현주도 해석과 감상을 관객에게 맡기려 했다. 게다가 발사 장면을 보여 주지 않으려고 했다. 인공위성 발사 이후 영화가 만들어지고 작품 활동이 계속됐지만 그것은 의미를 부여하려는 필사적인 노력 덕분이었다.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일(꿈)에 대한 대가는 혹독했다. 미디어 작가의 제목 덕분에 라디오 스타라는 예능에도 출연했고 작품 소재로도 활용할 수 있었지만 드라마틱한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발사했지만 제작비를 하루카에 넘는 비용이 들어 지구에서 교신할 수 있는 안테나를 세우지 못했다. 지구에서 신호를 보내면 반짝이는 그 작은 기능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발을 빼야 한다는 생각도 매몰비용이 떠올라 못하게 됐다. 로켓을 발사한 그 짧은 순간 그는 광택이 흐르는 푸른 옷과 Science is Fantasy라는 메시지가 붉은색 휘장을 휘장 삼아 춤을 추었다.
하지만 나는 그 장면이 마치 흥미를 추구하는 도마뱀이 몸을 활짝 벌리고 구애의 춤을 추는 것처럼 보였다. 제발 어딘가에 눈에 띄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처럼.
지성인에게는 누구나 자신의 지성을 누군가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다. 송호준이 들인 비용에 비해 그는 적은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인생 전반을 투자해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지만 관심도 얻지 못하고 기능적으로도 실패했다.
그는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예술이야? 관심병이야?
손호준의 망원동 인공위성을 보면 그 행위에 대한 문제의식이 떠오른다. 아무 가치도 없는 것에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을 알면서 하는 일, 공짜 하고 싶어서 하는 일, 무위적인 일
인생을 생각할수록 망원동 인공위성은 다른 한편으로 삶 그 자체라는 생각이 들었다. 목적 없이 태어나서 하고 싶은 것을 참는 것. 편안함과 따뜻함, 포만감을 추구하는 게 삶의 전부일까 차가운 베트남의 겨울에 쏟아지는 비를 피해 나무 아래서 컵라면을 먹는 것이 행복하지 않을까. 깊은 밤 사자가 절벽이 있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잘못일까.
![재구성, 재난+다큐멘터리+법정 스릴러 느낌까지! [미드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재구성, 재난+다큐멘터리+법정 스릴러 느낌까지! [미드체르노빌] 원전 사고의](https://blog.kakaocdn.net/dn/b3pY6E/btrEgwtjVl4/plCVyKrBWjQMCLamR0I0i1/img.png)

![[다시 쓰는 착한 미술사] 비주류 미술사를 알려주는 실용교양서 [다시 쓰는 착한 미술사] 비주류 미술사를 알려주는 실용교양서](https://run.jegong.site/wp-content/plugins/contextual-related-posts/default.png)